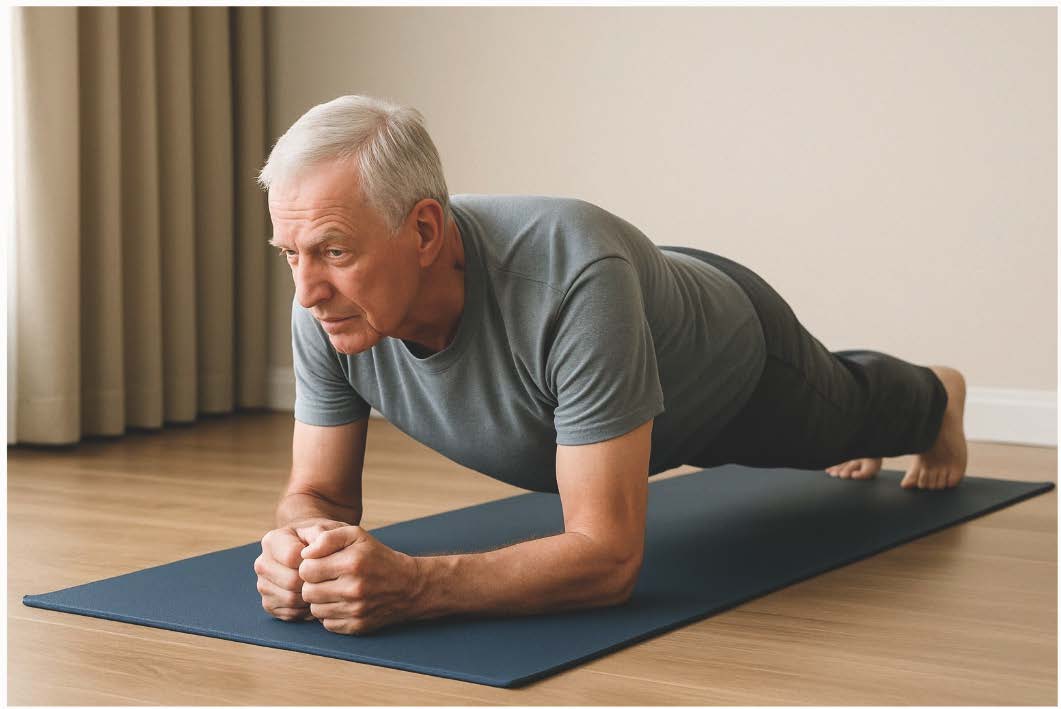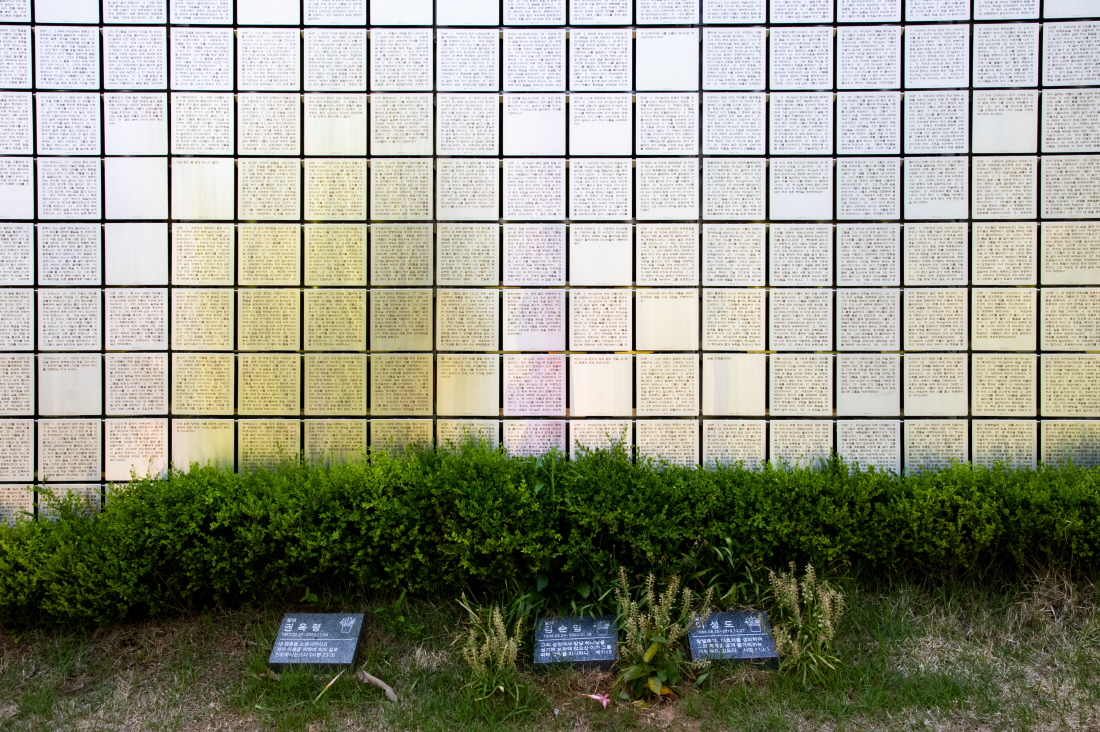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필자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새 학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를 사야 하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것에 익숙했기에 미국의 제도에 대해 신기하기도 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학교나 선생님들의 능력 차이가 나게 되면 공정하지 않을텐데? 나의 궁금증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존 리 대표의 경상북도 영양군 공무원 대상 강연
존 리 대표의 경상북도 영양군 공무원 대상 강연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에 와서 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나의 의견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중에 반드시 어느 제도가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에 관한 과제인데 미국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을 골라 그 대통령의 업적이나 과오 혹은 정책에 대해 스스로 리서치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시간에 왕들의 집권연대별로 암기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미국의 역사 교육과 한국의 역사 교육과는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에 대해 암기하기보다는 친구들이 각각 다른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서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야 공정하다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 나의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교과서가 따로 없는 대신 역사 선생님이 많은 역사에 관한 책 중에서 선택해서 학생들이 읽게 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객관식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는 에세이를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합니다. 역사 시간인지 작문 시간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배운 아이들과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분명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젊은 직원들이 대체로 우수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낸 문제를 반복적으로 맞추는 교육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들이 낸 문제를 더 잘 맞추기 위해 학원에 가서 많은 돈을 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노후준비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들의 학원비라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하고 점수 성적을 가지고 학교가 나누어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영향을 받는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취직을 하는 데도 시험을 치루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상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문제를 잘 맞추는 교육보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창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진출해서 큰 부를 이루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 가지 잣대로 평가 받는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공부 잘 하는 아이들보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고 창업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저를 초청해서 금융강연을 요청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낸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한국 사회를 꿈 꿔 봅니다.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 4. 7

 존 리 대표의 경상북도 영양군 공무원 대상 강연
존 리 대표의 경상북도 영양군 공무원 대상 강연